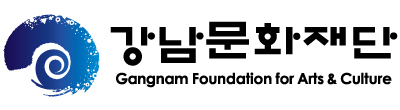간혹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마음속으로 거리를 취하게 될 때가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세상일까?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까지도 그런 거리를 취할 수 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이렇듯이 이 세계는 물론 자기 자신까지도 수수께끼처럼 낯설게 느껴질 때 우리는 철학자가 된다. 철학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기원전 6세기에서 4세기에 이르는 비슷한 시기에 동, 서양에서 인간은 자신이 그때까지 내내 몸담고 살아온 친숙한 세계의 밖에 서서, 그리고 나아가 자기 자신의 밖에 서서 세계와 인간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인간이 과연 세계와 인간 밖의 입각점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에 답을 모색하면서 인간은 현대 문명의 초석을 놓을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강의에서는 서양에서 철학이 시작되었던 시점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어떤 방향에서 그에 대한 답이 모색되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물론 당시 제기된 문제와 모색해낸 답이 철학의 전부는 아니다. 당시 제기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며 또 다른 문제를 낳고 또 그 다른 문제는 또다른 문제를 낳고 하는 식으로 문제제기로 이어진 탐구활동이 이제 이천년을 넘는 긴 철학의 역사를 쌓았다. 그러나 그 역사의 두께를 헤치고 출발시점에서 제기된 문제를 항시 상기해야 하는 것이 철학의 숙명이다. 세계와 자신에 대하여 낯설다는 느낌이 둔화되면 철학은 생명력이 없는 김빠진 학문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류가 처음 세계와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낯설게 여기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말하자면 철학적 사색의 추동력을 새로 공급 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로그인
철학의 기원
2013-03-05조회수 5088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다음글 알베르 카뮈의 작품에서 '인간'을 읽는다
- 이전글 인간을 보는 새로운 시선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06088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5층 강남문화재단
[경영관리부] 경영지원팀 02-6712-0541~50 | 재무회계팀 02-6712-0570~4 | 문화센터팀 1833-8009 | 시설관리팀 02-6712-0575~8
[문화사업부] 문화정책팀 02-6712-0511~5 | 지역문화팀 02-6712-0521~6 | 독서진흥팀 1644-3227
[예술단사무국] 예술단지원팀 02-6712-0531~5
COPYRIGHT ⓒ 강남구청. ALL RIGHTS RESERVED.. / Design vector created by freepik - www.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