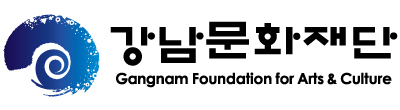제 1강 - 10월 21일 : 고독한 인간 <이방인>
제 2강 - 10월 28일 : 함께사는 인간 <페스트>
카뮈는 1957년 말 스톡홀름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연설에서 말했다. “나는 처음 시작 때부터 내 작품세계의 정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었다. 나는 우선 부정(否定)을 표현하고자했다. 세 가지 형식으로. 그것이 소설로는 「이방인」, 극으로는 「칼리굴라」와 「오해」, 사상적으로는 「시지프 신화」였다. 나는 또 세 가지 형
식으로 긍정을 표현하기로 예정하고 있었다. 소설로는 「페스트」, 극으로는 「계엄령」, 「정의의 사람들」,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반항하는 인간」이 그것이었다.
나는 그때부터 벌써 사랑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세 번째 층도 막연하게나마 생각했다.” 그러나 “사랑”을 주제로 하는 “세 번 째 층”은 작가의 예기치 못한 죽음으로 인하여 실현을 보지 못했다.
소설 「이방인」은 카뮈가 구상한 첫 째 번 층위인 “부정”, 즉 “부조리” 삼부작 중 하나로 그에게는 최초의 소설이다. 여기서 철학적 에세이는 설명하고 소설은 묘사하고 연극은 이 부조리의 감정에 생명과 운동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 한가운데로 1939년 가을에 발발한 2차 세계대전이 관통한다. 「이방인」은 고독한 개인을 삶이란 과연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세워놓는다.
그 질문은 소설 속에서 한 평범한 인간이 맞닥뜨리는 세 가지 죽음을 통해서 제기된다. 어머니의 죽음, 주인공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사건, 그리고 살인의 결과로 받게 되는 사형 선고가 그것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언듯 보기에 부정적인것 같아 보인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죽게 마련이고 그 필연적인 죽음은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이다.
이 부정적인 결론에 이어 카뮈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동시대 인간들에게 제기하는 두 번째 단계의 질문.
필연적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인간조건 때문에 인생이 살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이제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삶이 무의미하므로 삶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계속 살아야 할 것인가?
카뮈의 답은 “부조리의 논리”에 따른 반항이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주어진 조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타고난 조건에 대하여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항하며 “아니다”라고 답해야 한다. 그는 삶의 부조리 앞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 이 긍정의 선택이 바로 거대하고 집단적인 재난 소설 「페스트」의 이야기다.
이제 부터는 고독한 개인의 부조리한 삶을 넘어서야한다. 인간 상호간의 연대성에 기초한 집단적 반항과 긍정이 핵심이다. 모든 반항 속에는 부정과 동시에 긍정이 도사리고 있다. 노예가 주인에게 반항할 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거부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존재를 긍정한다. 그의 부정과 거부의 근거는 인간이 공통되게 지니고 있는 존엄에 대한 긍정이다. 2차 세계대전의 저 절망적인 경험은 “나는 반항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라는 반항의 긍정에 도달한다.


로그인
알베르 카뮈의 작품에서 '인간'을 읽는다
2013-03-05조회수 67756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다음글 제 4의 물결, 건강한 사회
- 이전글 철학의 기원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06088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5층 강남문화재단
[경영관리부] 경영지원팀 02-6712-0541~50 | 재무회계팀 02-6712-0570~4 | 문화센터팀 1833-8009 | 시설관리팀 02-6712-0575~8
[문화사업부] 문화정책팀 02-6712-0511~5 | 지역문화팀 02-6712-0521~6 | 독서진흥팀 1644-3227
[예술단사무국] 예술단지원팀 02-6712-0531~5
COPYRIGHT ⓒ 강남구청. ALL RIGHTS RESERVED.. / Design vector created by freepik - www.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