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人우주로] '우주병' 난 이소연, 정상회복 될까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한국인 최초 우주인 이소연씨가 9박10일 일정의 우주과학실험을 마치고 19일 우주로 귀환환다.
카자흐스탄 초원지대에 안착한 그녀가 잠깐의 인사를 한뒤, 직행할 곳은 다름아닌 '병원'이다. 그동안 우주에서 어느정도 적응했던 이씨의 몸이 다시 지구환경에 재적응, 정상회복하는 일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주에서 확 바뀐 몸
무중력 상태인 우주에서 이씨는 신체 여러 곳에서 변화를 경험했다.
가장 큰 변화는 키가 3㎝나 훌쩍 커버린 것. 이는 무중력상태에서 척추의 뼈, 뼈 사이 연골, 관절 등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
그러나 이는 갑작스런 변화로 인해 척추와 허리의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다리도 거의 쓰지 않아 마치 깁스한 것처럼 하체 부실도 우려된다. 이같은 관절의 변화는 대표적인 우주병 증상이다.
얼굴도 훨씬 커지게 된다. 무중력상태인 우주에서는 피가 아래쪽으로만 흐르지 않고 몸 위쪽으로도 올라간다. 이로인해 피가 상체와 머리의 혈액이 증가하게 되면서 세포 내외부 수분의 변화를 일으켜 수분이 위로 몰리면서 얼굴이 붓게 된다.
무중력상태는 혈압의 변화를 일으켜 눈과 심장의 변화도 일으킨다. 머리쪽의 압력이 상승하면서 안압이 상승하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량 증가로 심박수도 변화를 보이게 된다. 이에 이씨는 우주에서의 안압 심박동 변화 실험을 18가지 과학실험의 하나로 측정하고 온다.
혈압상승으로 인한 머리 내 압력증가로 두통도 발생해 우주비행 초기부터 우주멀미는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동안 우주환경에 적응해던 몸이 다시 지구로 돌아올때도 변화를 일으켜 우주멀미는 반복된다.
◇수면각성주기, 컨디션 회복 관건
우주인들이 가장 괴로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구에서처럼 숙면을 취할 수 없어 발생하는 '수면'의 고단함이다.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선 24시간 동안 해가 90분 간격으로 16번 뜨고 지면서 밤낮이 수시로 교차하면서 기존의 '수면각성주기(생체 주기)'를 교란시켜 수면을 방해한다. 심한 경우, 수면제를 복용하는 우주인이 있을 정도다.
수면각성주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빛'이다. 빛의 양, 즉 밤낮의 변화에 따라 수면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는 해외의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발생하는 시차의 변화로 잠을 제대로 못자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이씨 역시 몸의 정상상태로 회복하는데 수면각성주기를 과거처럼 되돌리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숙면을 취해야 몸이 제기능을 하기 때문.
지구로 돌아오면 우선 시간요법을 통해 기존처럼 아침과 저녁을 철저히 구분해 낮에는 활동을, 밤에는 일부러 어두컴컴하게 해서라도 잠들게 하는 이른바 '수면각성주기 세팅' 작업을 한다.
그래도 힘들면 원래 시간주기에 맞게 빛을 쬐는 '광치료'와 밤에 분비돼 수면각성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치료를 해야 한다.
대한수면의학회 박두흠 학술이사(건국대병원 신경정신과)는 "제일 효과적인 것은 빛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신체의 수면각성주기를 외부의 현상(밤낮 변화)를 일치시키는 작업이 이씨에게 가장 먼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전문의들은 이소연씨가 우주에서 유발한 각종 신체변화는 단시간의 우주비행에 따른 것으로 "심각한 후유증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강성심병원 정형외과 김석우 교수는 "우주의 무중력상태는 근육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근력도 떨어지고 뼈의 골밀도도 떨어진다"며 "이런 현상이 장시간 지속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만 체류기간이 짧은 이씨는 1주일 정도면 정상회복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SBS 제공>
석유선기자 sukiza@mdtoda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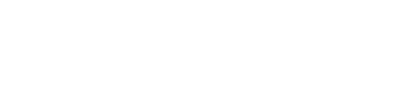
06143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320(역삼동681-43) 강남구함께나눔센터 4층~7층 | TEL. 02-544-8440
사업자등록번호 : 211-89-00449 | 대표자 : 서숙경 | E-MAIL : she@herstory.or.kr
COPYRIGHT ⓒ 강남구청. ALL RIGHTS RESERVED..










![[우먼파워]'우주병' 난 이소연, 정상회복 될까 전자점자뷰어보기](/assets/images/common/braille_btn.png)
![[우먼파워]'우주병' 난 이소연, 정상회복 될까 전자점자다운로드](/assets/images/common/braille_btn_down.png)
